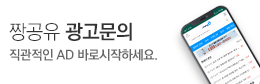인생은 길지 않다. 그렇다고 짧지도 않다. 4
8.
나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사업체를 꾸렸다.
고백하자면 내 삶에 이런식으로 사업체를 경영하게 될 것이라 꿈도 꿔보지 않았다.
당시 재미로 만들었던 커뮤니티가 점점 커졌고 몇번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투자 제안이 들어왔었다.
벤쳐 광풍이 불던 시기였다.
테헤란로 길거리 개는 천만원짜리 수표를 입에 물고 돌아다닌다는 풍문이 있었고
이십대 후반 벤쳐 사장들이 페라리와 포르쉐를 끌고 다니며 하루 술값으로 몇천씩 쓴다는 풍문이 돌았다.
그럴듯한 아이템만 있으면 사업 계획서 PPT 한장당 10억씩 투자를 받을수 있다는류의 소문은 솜사탕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일까?
내게도 투자 제안이 들어왔다.
내가 소유한 커뮤니티는 나날이 커져갔다.
문제는,
커지는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수익과 결부 시키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런 시기였다.
나만 몰랐던게 아니라 당시 '벤쳐' 라 불리우던 대부분 IT 기업들도 그 방법을 몰랐다.
사실이 어떻든 금융공학을 직업으로 가진 이들에게는 IT기업이란 아주 좋은 불쏘시개였다.
그들에게 기업 가치나 수익성은 부차적인 문제였고 당장 중요한건 투자자들에 군침을 흘리게 할수 있는 소재성이었다.
나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마도,
평범한 나라면 내 등에 붙어 있던 대기업 간판을 스스로 내 던져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애시당초 그럴 용기나 배짱도 지니지 못했다.
조금 더 냉정히 판단하고 차분히 기다려 보는 전략을 택했을 것이다.
안개에 가려 길도 보이지 않는 곳 끝단에 놓인 황금덩어리보다 안전하게 소시민적인 내 삶이나마 보장 받을수 있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마음이 급했다.
사직서를 제출 하자 마자 잠실 근처에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충원했다.
조금 이라도 빨리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었다.
서둘러 사다리를 올라가야 실낱같은 기회라도 잡을수 있을것 같았다.
그리고 그 즈음으로,
벤쳐 열풍이 급격히 사그러 들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벤쳐 기업에 대한 장미빛 미래를 토해내던 언론들은 대한민국 부실경제의 주범으로 벤쳐 기업을 지목하기 시작했다.
미래 가치는 창연하지만 실질적 수익 창출 방법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론은 몰랐다는듯 호들갑을 떨었다.
투자 받기로 되어 있었던 자금은 일주일이 밀리더니 이주일이 밀리고 한달이 밀렸다.
어제까지 황제주로 떠받들어지던 벤쳐 기업 사무실은 하루 아침에 공실로 남기 시작했다.
나는 광풍이 휘몰아 치는 광야 한가운데 벌거벗고 서있었다.
9.
사무실을 개소하고 두달여쯤 지난 밤 혼자 남은 사무실에 그녀가 찾아왔다.
"사무실 이쁘게 잘 꾸며 놨네" 라고 말했고 "그렇지 뭐. 라고 대답했다.
밤 열시가 넘은 시간 이었다.
그녀는 검정색 쓰리피스 정장에 하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굵게 말려 내려오는 머리는 여태 마주해 보지 못했던 성숙미를 느끼게해 당황스러웠다.
나는 일이 바쁘다고 했고 조금 곤란한 일들이 있지만 아마도 잘 해결될 수 있을것이라 얘기했다.
그녀는 비가 올듯 말듯 일주일 내내 찌푸린 날씨에 대해 말했고 다니던 직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말했다.
의미 없이 이어지던 대화가 삼십분 정도 이어진 후 딱 끊겨 버렸다.
우리 대화는 그녀와 나 중간 지점에 숨어있던 블랙홀이 순식간에 삼켜 버린것 같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나는 물었다.
"만나는 사람은 어때? 의사라 그랬지?" 라고 물었다.
태연한척 하려 했지만 손안에 식은 땀이 베이기 시작했다.
"그냥 뭐........"
그녀도 태연히 대답했다.
아니, 태연해 보이려 노력했다.
나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 말을 삼켰다.
다시 고요한 적막이 흘렀다.
그녀 직업을 생각했고, 철옹성 처럼 완고하다는 그녀 아버지를 생각했으며, 나날이 늦어 지던 회사 투자 자금에 대해 생각했다.
"부모님은 일년 정도 적당히 사귀다 결혼 하라시네. 아빠 친구 아들이니까 대놓고 신뢰 하시나 봐"
아...........
짧막하게 그래, 라고 대답하고는 갑자기 너털거리는 웃음이 나왔다.
갑자기 가보지도 못한 그녀가 산다는 넓다란 아파트가 생각났다.
언제가 그녀를 바래다 주기 위해 들어갔던 주차장과 주차장에 개구리처럼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슈퍼카도 떠올랐다.
그리고 갑자기 '이게 정상인거잖아? 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어쩐지 얼굴에 비굴한 웃음이 새겨진 느낌이었다.
그러다 그 집 거대한 거실에 내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상상이 들기 시작하자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나는 혼자 헛헛 헛웃음을 짓다 순식간에 열패감에 휩싸였다.
그녀와 나 사이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창 밖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불빛들이 그녀와 내 얼굴을 횡으로 붉게했다 사라졌다.
"오빠"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회사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오빠 나랑 도망갈래? 조금 먼데라도 괜찮다면?"
나는 미동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던져진 그녀 말에 뇌가 순식간에 얼어 버린 것 같았다.
순간 잘 못 들은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침묵을 깨고 다시 그녀가 말했다.
"나는 괜찮은데. 바닷가로 도망가서 오빠가 어부를 한다고 해도 살 수 있을것 같은데."
그녀 말의 함의를 파악하기도 전에 작은 나룻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퍼대기 뒤에 아기를 업고 나를 마중 나오는 모습도 상상했다.
어쩐일 인지 차라리 달이 폭파해 지구가 멸망해버리는 SF영화가 훨씬 더 현실적일거란 생각이 들었다.
왠지 상상해서는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응했다.
문득 내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거야. 피식 웃었다.
그러다 생각했다.
내 손에 쥐어쥔건 버릴수 있는 것들 이지만 그녀 손에 쥐어진 것들은 버릴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녀 손에 쥐어진건 선택받은 자들이 애초에 몸에 부착하고 나온 황금 같은 것이었다.
그런건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것들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서 그렇게 힘든일 못 해. 뱃 일이 생각외로 굉장히 힘들대"
그녀는 내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다.
아무 반응이 없자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그녀는 오래 같은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그녀가 책상에 올려뒀던 백을 집어 들었다.
"오빠 나 갈게. 회사 번창 하길 바래."
입구로 걸어가는 그녀를 천천히 뒤 따라갔다.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침묵이 우리를 감쌋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안으로 들어간 그녀에게 말했다.
"잘가. 건강하고."
그녀는 빤히 내얼굴을 바라봤다.
"오빠."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아까 그 말 진지한 말 이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채 그녀를 바라봤다.
"안녕 오빠."
엘리베이터 문이 닫기기 시작했다.
 hyundc의 최근 게시물
hyundc의 최근 게시물